기준금리동결,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상관관계 간단하게 알아봅니다.

요즘 주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종목선택이나 지수투자방식으로 직접 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주식이나 채권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확인해 봐야 하는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그중 오늘은 금리란 무엇이고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상관관계를 통해 금리의 기본틀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래 신문기사를 통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한국은행이 15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연 0.5%의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코로나 19로 위축된 실물경제를 뒷받침해야 하는 만큼 사상 최저인 기준금리를 유지했다.
이렇듯 금리를 동결했는데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다 라는 애기들을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금리를 동결했는데 왜 금리가 오른다는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금리가 무엇이고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알고 가셔야 하는데요.
먼저 금리란 무엇일까요?
금리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지만 굳이 정리를 하자면 돈의 값이라고 애기할 수 있는데요. 돈을 썼을때 내야되는 값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더 쉽게 이자라고 애기를 하고 있구요 영어로는 Price라고 하는데 이 Price라고 하는 것은 가격을 의미하기도 하죠.
이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은 다들 아실테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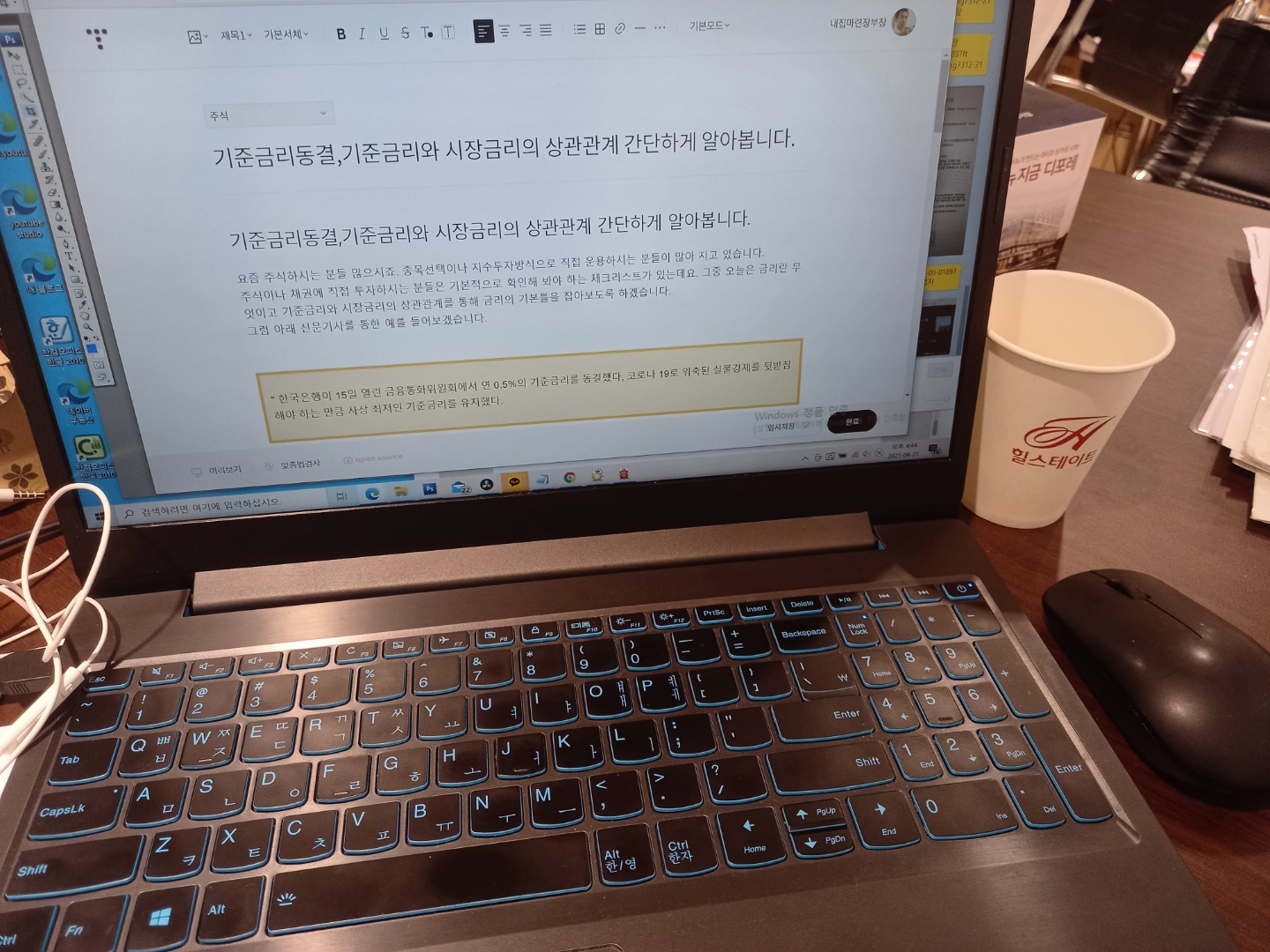
자 그럼 예전 IMF시절을 기준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너무 오래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의 너무 중요한 변곡점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IMF이전에는 우리나라가 성장이 매우 잘 나왔던 때입니다. 기업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던 때이기도 하였구요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돈의 가격이라고 하는 금리는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IMF이전 시대를 고금리시대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대출을 너무 많이 받은 상태에서 IMF라는 큰 파도를 만나면서 기업들의 재정이 악화되고 기업투자가 실종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한국은행에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공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투자를 안한다는 것은 돈의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고 그에 비해 공급은 늘어났으니 당연히 돈의 값인 금리는 내려가게 된 것이고 이 시대를 우리는 저금리시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말 중요한 경제 변곡점이고 금리를 설명하기에 딱 좋은 시기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와 비교해 보시면 코로나가 터지고 경제가 완전 무너진 상태에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전세계적인 부양책들이 쏟아지면서 시장에 엄청난 양의 돈이 공급되면서 돈의 값인 금리가 최저점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역대급 저금리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돈의 값이라고 하는 금리중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에 대해서 구분을 해보셔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위에서 애기했던 금리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장금리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구요.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원리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통제가 안되는 상황인 경우 정부가 가격을 통제한다 즉 그 나라의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금리라고 아시면 되는데요.
위의 예를 든 신문기사에 기준금리를 0.5%로 동결했다. 라고 하는 것은 금리를 0.5% 가이드라인으로 잡아놓고 떨어지면 돈을 회수해서 올리고 올라가면 다시 공급해서 떨어뜨리는데 그 기준을 금리 0.5%로 잡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준금리는 각 국의 중앙은행에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렇다고 마구잡이로 돈을 찍어대면 안되겠죠 그렇다면 돈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담보물이 있어야 됐지만 지금은 무엇을 담보로 돈을 찍어내느냐 하면 바로 그 국가의 신용을 바탕으로 돈을 찍어내게 되는데요.
이렇게 국가에서 돈을 찍어낸다 라고 하는 것을 국채를 발행한다 라고 하는데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공신력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에 깔고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국가의 신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국가의 신용을 바탕으로 돈을 찍어낸다라고 했을때 이 국채는 기간이 정해져 있게 되는데요. 만일 이 기간이 길게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뉴스에서도 접해보셨겠지만 그리스 같은 경우 국가부도사태도 벌어지고 하니 너무 기간이 길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초단기 국채를 대상으로만 돈을 찍어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7일짜리 금리만을 애기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1일짜리 금리를 담보로 해서 돈을 찍어냅니다.
기준금리는 초단기국채금리고 중앙은행이 통제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이 이외의 금리는 다 시장금리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기준금리는 동결을 했는데 왜 시장금리는 오르는 것일까요? 라는 의문에 대한 애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예로 들면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전 세계적으로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라 재정지출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정부가 재정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여기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오는 방법이 있고 두번째는 국채를 발행해서 재정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첫번째 방법은 무리가 있는 것이 현 경제가 안좋은데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다?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을 위해 먹고살기 힘들어진 국민들의 돈을 더 걷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애기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두번째 방법인 국채를 발행하게 되는 것인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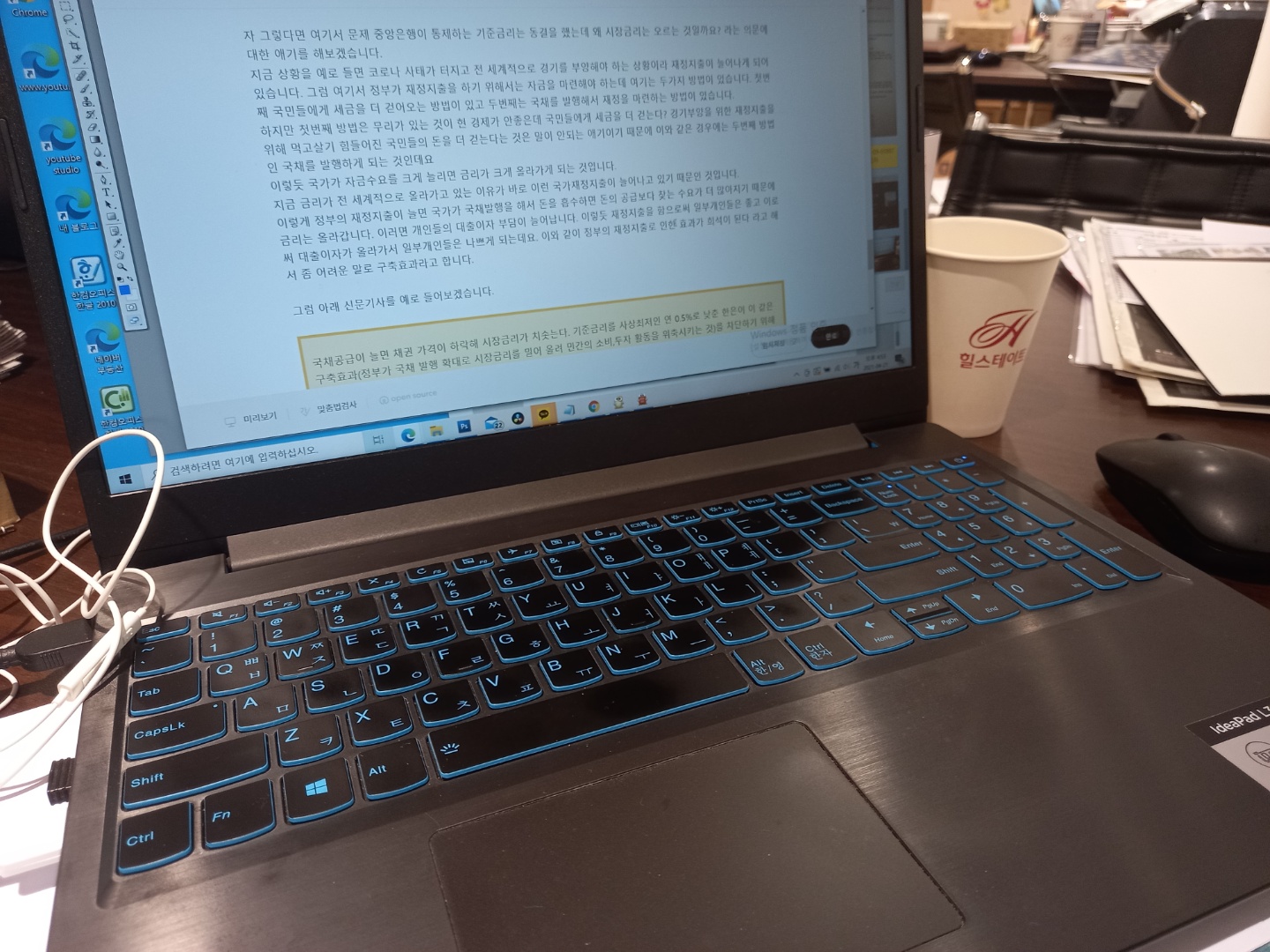
이렇듯 국가가 자금수요를 크게 늘리면 금리가 크게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금리가 전 세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국가재정지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의 재정지출이 늘면 국가가 국채발행을 해서 돈을 흡수하면 돈의 공급보다 찾는 수요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금리는 올라갑니다. 이러면 개인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납니다. 이렇듯 재정지출을 함으로써 일부개인들은 좋고 이로써 대출이자가 올라가서 일부개인들은 나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정부의 재정지출로 인한 효과가 희석이 된다 라고 해서 좀 어려운 말로 구축효과라고 합니다.
그럼 아래 신문기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국채공급이 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해 시장금리가 치솟는다. 기준금리를 사상최저인 연 0.5%로 낮춘 한은이 이 같은 구축효과(정부가 국채 발행 확대로 시장금리를 밀어 올려 민간의 소비,투자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를 차단하기 위해 국채 매입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구축효과는 최근에도 포착됐다. 3년 만기 국채금리는 지난 17일에는 0.01%포인트 오른 연 0.999%를 기록해 지난 4월 29일(연 1.006%)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3년 만기 국채금리는 지난 8월 5일 연 0.795%로 사상 최저를 기록한 직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채 10년물 금리도 지난 17일 연 1.732%로 지난 1월 20일(연1.762%)후 최고지를 기록한 바 있다.
이렇게 기사내용을 토대로 구축효과라는 용어를 이해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에 대해서 어느정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계속해서 이런 경제공부를 통해 돈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금융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주식 증거금이란? 주린이들을 위한 주식용어공부 (6) | 2021.05.02 |
|---|---|
| 주식 예수금이란 무엇인가 알아봅니다. (18) | 2021.05.01 |
| 주식 공매도란? (0) | 2021.04.17 |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이렇게 하세요 (0) | 2021.04.16 |
| 다우지수, 나스닥지수, S&P500지수 미국의 3대 지수에 대해 알아봅니다. (0) | 2021.04.11 |